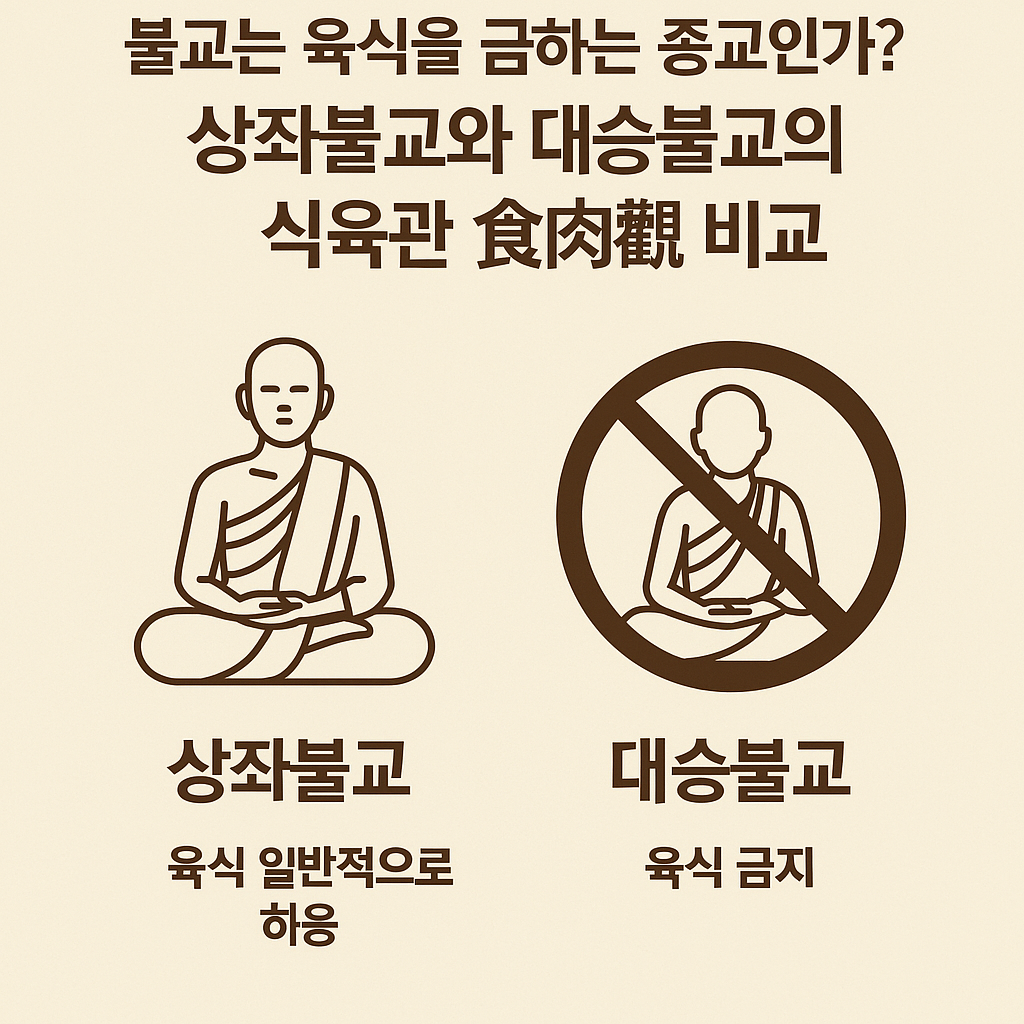菩提道燈論 阿底峽(阿提沙 Atīśa)尊者 造 (예경삼보) 敬禮曼殊室利童子菩薩 문수사리동자보살에게 공경히 예를 올립니다. 禮敬三世一切佛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及彼正法與僧眾 그의 바른 가르침과 스님들께 공경히 예를 올립니다. (서술연기) 應賢弟子菩提光 어진 제자 보리광이 깨달음에 나아가는 횃불을 잘 드러내 勸請善顯覺道燈 보이길 권청함에 응하노라. (상중하의 근기) 由下中及上 應知有三士 상중하의 근기의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하나니 當書彼等相 各各之差別 그들 각각의 차별을 기록하리라 若以何方便 唯於生死樂 만약 여러 방법으로 오직 세상의 즐거움에서 但求自利益 知爲下士夫 다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下士이다. 棄三有樂 遮止諸惡業 삼유의 즐거움을 버리고 모든 악업을 막아서 但求自寂滅 彼名爲中士 다만 자신의 적멸..